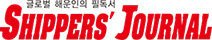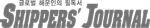△고려해운 컨테이너선. [사진=고려해운]
국내 중견
컨테이너 선사인 고려해운이 선단 대형화 전략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에 나섰다. 40여
년 만에 미주 항로에 재진출한 가운데, 초대형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를 통해 북미·멕시코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1일 해운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고려해운은 최근 HD현대그룹 조선 계열사인 HD한국조선해양과 총 4척 규모의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신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약 6억 달러에 이르며, 척당 가격은 1억5,0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우선 2척에 대한 본계약이 이뤄졌고, 옵션 물량을 포함해 최대 4척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납기는 2028년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업계에서는
고려해운이 HD현대와 투자의향서(LOI)를 교환한 사실이
포착되면서 초대형선 발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LOI는 통상 본계약 전 체결하는 가계약 성격의
문서로, 실제로 한 달여 만에 본계약이 성사되며 양사의 협력이 공식화됐다.
고려해운이
발주한 1만3,000TEU급 선박은 ‘네오파나막스(Neo-Panamax)’로 불리는 선형에 속한다. 길이 366m, 너비 51m, 흘수 15m의 사양으로, 파나마 운하 신(新)갑문을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다. 컨테이너선 기준으로는 1만3,000~1만5,000TEU급이
이에 해당하며, 글로벌 선사들이 미주·유럽 항로 투입을 위해
선호하는 규격이다.
이번 발주는
고려해운이 북미·멕시코 노선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고려해운은
전통적으로 동남아·중국 등 아시아 항로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왔으나,
지난해부터 원양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장금상선과 함께 동북아-멕시코 노선을 개설했고, 6월에는
싱가포르 씨리드(Sea Lead), 대만 TS라인과 손잡고
미주 서안 노선 서비스를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사실상 단절됐던 미주 항로 재진출에 성공하며, 선대 확충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고려해운의 행보를 두고 단순한 미주 서안 노선 강화뿐만 아니라 중동·인도 등 신흥 원양항로 확장을 위한
포석으로도 보고 있다. 실제로 고려해운은 지난해 11월 HD현대삼호중공업에 8,7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발주했으며, 오는 2027년
초 인도·중동 항로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초대형선
역시 미주 동안 노선 진출이나 중동항로 운용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열어둔 채 발주가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고려해운의
초대형선 발주는 장금상선의 행보와도 맞물려 업계의 관심을 끈다. 장금상선은 지난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중공업에 동일한 1만3,000TEU급 선박 4척을
발주한 바 있다. 탈황장치(스크러버)를 장착해 고유황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척당 가격은 약 1억5,300만 달러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고려해운과 장금상선이 나란히 초대형선을 확보하며 장차 미주 동안 노선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선사가 각각 독자적으로 선복량을 늘려 원양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경우, 국내
중견 선사들이 글로벌 해운 동맹 구도 속에서 새로운 경쟁 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해운조사기관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고려해운은 현재 총 63척, 14만3,569TEU의 컨테이너선을 운영 중이다. 이 중 자사선은 30척, 용선은 33척이다. 이는 글로벌 컨테이너선사 순위 17위에 해당한다. 대형 선사들이 100만TEU 이상을
운용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규모가 작지만, 꾸준한 선대 확충을 통해 원양항로 영향력을 키워가는 단계로
평가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고려해운의 이번 초대형선 발주는 단순히 선박 확충 차원을 넘어 미주·중동 등 전략 항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포석”이라며 “HD한국조선해양 역시 이번 계약으로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다시금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중견 선사들의 연이은 초대형선 발주는 글로벌 해운업계에서 한국 선사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주를
계기로 고려해운은 40년 만의 미주 항로 복귀에 탄력을 받게 됐다. 향후
실제 투입 노선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도에 따라 글로벌 시장 내 위상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